
мқҙ мұ…мқҳ мӨ„кұ°лҰ¬лҠ” кіөл¶ҖлҘј мӢ«м–ҙн•ҳлҠ” мЈјмқёкіө мҳҒмҡұмқҙмҷҖ н‘ңмӢңн•ң-н• м•„лІ„м§Җ м„ұн•Ё- н• м•„лІ„м§Җмқҳ л§Ҳм§Җл§ү мҲңк°„л“Өмқҳ мқҙм•јкё°лҘј лӮҳнғҖлӮҙлҠ” мұ…мқҙлӢӨ. мҳҒмҡұмқҙмқҳ м•„л№ лҠ” л№ө집мқ„ н•ҳкі кі„мӢ лӢӨ. к·ёлҰ¬кі мҳҒмҡұмқҙм—җкІҢлҠ” м—„н•ҳмӢ 분мқҙлӢӨ.
к·ёлһҳм„ң мҳҒмҡұмқҙлҠ” м•„л№ ліҙлӢӨ н‘ңмӢңн•ң н• м•„лІ„м§ҖлҘј лҚ” мўӢм•„лқјн•ңлӢӨ. н• м•„лІ„м§ҖлҠ” л§ҺмқҖ мһ¬мӮ°мқ„ л¬јл Өл°ӣмңјм…ЁлӢӨ.
н•ҳм§Җл§Ң мӮ¬м—… мӢӨнҢЁмҷҖ мқҙнҳј нӣ„м—җ кІӘмқҖ мӮ¬кё° л“ұмқ„ кІӘкІҢ лҗҳкі к·ё нӣ„ л№ҡмқ„ м§ҖкІҢ лҗҳм—ҲлӢӨ.
к·ёлҰ¬кі мҳҒмҡұмқҙмқҳ м•„л№ к°Җ лҸҲмқ„ лӢӨ к°ҡм•„мЈјкі м§‘м—җ к°ҷмқҙ мӮҙкІҢ лҗңлӢӨ. мҳҒмҡұмқҙмҷҖ н• м•„лІ„м§ҖлҠ” н•ң л°©м—җм„ң к°ҷмқҙ мӮ°лӢӨ.

н•ҳм§Җл§Ң н‘ңмӢңн•ң н• м•„лІ„м§ҖлҠ” мҳҒмҡұмқҙмқҳ м•„лІ„м§Җмқё мҰү мһҗмӢ мқҳ м•„л“Өмқҳ лҲҲм№ҳлҘј ліҙл©° мӮҙм•„к°ҖмӢ лӢӨ.
н• м•„лІ„м§ҖлҠ” мӮ¬мҡ°лӮҳм—җ к°ҖлҠ” кІғкіј л°•л¬јкҙҖм—җ к°ҖлҸ„ к·ёкІғл“Өмқ„ лӘЁл‘җ мқҙлІӨнҠёлқјкі л¶ҖлҘёлӢӨ.
к·ёлҰ¬кі л…ёмқём • н• м•„лІ„м§ҖмҷҖ н• лЁёлӢҲл“Өм—җкІҢлҠ” нңҙлҢҖнҸ° кё°лҠҘлҸ„ м№ңм Ҳн•ҳкІҢ м„ӨлӘ…н•ҙ мЈјмӢңлҠ” 분мқҙмӢңлӢӨ.
м–ҙлҠҗ лӮ н•ӯмғҒ н• м•„лІ„м§Җк°Җ л“ңмӢңлҚҳ нҷңлӘ…мҲҳ м„ёлі‘мқ„ мӮ¬лӢ¬лқјлҠ” л¬ёмһҗлҘј ліҙкі к°ҷмқҖ л°ҳмқё
ліҙлқјмқҳ м–ҙлЁёлӢҲк°Җ мҡҙмҳҒн•ҳмӢңлҠ” ліҙлһҢм•Ҫкөӯм—җм„ң н•ңлі‘мқ„ мӮ¬кі 집м—җ к°„лӢӨ.

н•ҳм§Җл§Ң к·ёкұё л“ңмӢңкі лӮҳм„ң н• м•„лІ„м§ҖлҠ” мЎ°м Ҳмқҙ лҗҳм§ҖлҘј м•Ҡм•„м„ң нҷ”мһҘмӢӨм—җм„ң мҳӨмӨҢмқ„ л°”м§Җм—җ мӢёкі л§ҢлӢӨ.
к·ёлҰ¬кі н• м•„лІ„м§ҖлҠ” к·ёлӮ л°Ө. лҸҢм•„к°ҖмӢңкі . мҳҒмҡұмқҙл„ӨлҠ” мһҘлЎҖмӢқмһҘм—җ к°ҖкІҢ лҗңлӢӨ.
лӮң мқҙ мұ…мқ„ мқҪкі лӮҳм„ң н•ңм°ёмқ„ м—¬лҹ¬к°Җм§Җ мғқк°Ғмқ„ н•ҳл©° мғқк°Ғм—җ мһ кё°м—Ҳм—ҲлӢӨ. мҳҒмҡұмқҙк°Җ мһҘлЎҖмӢқмқ„
кҙҖм°°н•ҳлҚҳ л¶Җ분м—җм„ң кіөк°җк°ҖлҠ” л¶Җ분л“Өмқҙ л§Һм•ҳлӢӨ. к·ёлһҳм„ң лӮҳлҸ„ лӘЁлҘҙкІҢ мҲЁмЈҪм—¬к°Җл©° 진м§Җн•ҳкІҢ мқҪм—ҲлҚҳ кІғ к°ҷлӢӨ.
мқҪлҠ” лӮҙлӮҙ лҸҢм•„к°ҖмӢ н• лЁёлӢҲк°Җ мғқк°Ғмқҙ лӮ¬кі н• лЁёлӢҲк°Җ мӮҙл©ҙм„ң лӮҳм—җкІҢ н•ҙмЈјм…Ёл–Ө кІғмқ„ лҸҢмқҙмјңліҙм•ҳлӢӨ.

л¬ёмһҗк°Җ к°ңл°ңлҗҳм—Ҳмқ„ л¬ҙл ө мҡ°лҰ¬ н• лЁёлӢҲлҠ” к·ёлҹ° кІғмқ„ мһҳ м•Ңм§Җ лӘ»н–Ҳм—ҲлӢӨ.
мқҙ мұ…мқҖ лҲ„кө¬лӮҳ мқҪмқ„ мҲҳ мһҲлҠ” мұ…мқҙкі мӮҙм•„кі„мӢӨ л•Ңм—җ лҲ„кө¬л“ м§Җ к°„м—җ мһҳн•ҙмЈјм–ҙм•ј лҗңлӢӨлҠ” мӮ¬мӢӨмқҙ лӢҙкёҙ көҗнӣҲмқҙ мһҲлҠ” мұ…мқҙлӢӨ. мӮ¶кіј мЈҪмқҢм—җ лҢҖн•ҙ мқҙн•ҙлҘј к°–кІҢ н•ҙ мӨҖ мұ…мқҙм—ҲлӢӨ. м–ҙм©Ңл©ҙ к·ё кІҪкі„лҠ” л¶Ҳнҷ•мӢӨн• м§ҖлҸ„ лӘЁлҘҙкІ м§Җл§Ң.
лӮҙмӢ¬ мҳҒмҡұмқҙлқјлҠ” м•„мқҙк°Җ л¶Җлҹ¬мӣ лӢӨ. н• м•„лІ„м§Җлһ‘ к°ҷмқҙ мҲҷм ңлҸ„ н•ҳкі лӮҳлҸ„ мқҙ лӢҙм—җ н• лЁёлӢҲк°Җ лҗҳл©ҙ м Җ мЈјмқёкіөмқҳ м•„л№ лһ‘ н• м•„лІ„м§Җмқҳ кҙҖкі„мІҳлҹј м„ңлЁ№н•ң мӮ¬мқҙлҘј м•Ҳ л§Ңл“Өкі мӢ¶лӢӨ. к·ёлҰ¬кі н• м•„лІ„м§Җк°Җ мҳҒмҡұмқҙн•ңн…Ң н–ҲлҚҳ кІғмІҳлҹј.

мҶҗмһҗ мҶҗл…Җл“Өн•ңн…ҢлҸ„ мһҳн•ҙмЈјм–ҙм•јн•ҳкІ лӢӨ. мҡ°лҰ¬лҠ” мқҙл”°лҒ” л„Ҳл¬ҙлӮҳлҸ„ л¬ҙкұ°мҡҙ кІғмқ„ к°ҖліҚкІҢ м·Ёкёүн•ҳлҠ” кІҪн–Ҙмқҙ мһҲлӢӨ.
к°ҖмһҘ нҒ° мҳҲлҠ” мЈҪмқҢмқҙлқјлҠ” кІғмқҙлӢӨ. мЈҪмқҢ м•һм—җм„ң л„ҲлӮҳлӮҳлӮҳ н• кІғ м—Ҷмқҙ мҡ°лҰ¬лҠ” лӘЁл‘җл“Ө мҲҷм—°н•ҙм ём•јн•ңлӢӨ.
к·ёкұҙ л¶ҲліҖмқҳ 진лҰ¬мқҙкі лҳҗ к·ёкІғмқҙ мӮ¶мқ„ мӮҙм•„к°ҖлҠ” мһҗлЎңмҚЁмқҳ лҸ„лҰ¬мқҙлӢӨ.
н•ҳм§Җл§Ң мҡ”мҰҳмқҖ мЈҪмқҢмқ„ нқҘл°Ӣкұ°лҰ¬ мҳӨлқҪкұ°лҰ¬ мқҙм•јк№ғкұ°лҰ¬ л“ұл“ұмңјлЎң м·Ёкёүн•ңлӢӨ.
кіјм—° мһҗмӢ л“Өмқҳ мЈҪмқҢмқҙ к·ёл ҮкІҢ м·Ёкёүмқҙ лҗҳм–ҙ진лӢӨкі н•ҳл©ҙ к·ёл“ӨмқҖ мҰҗкұ°мҡёк№Ң мӣғмңјл©° мқҙм•јкё° н• мҲҳ мһҲмқ„к№Ң

л§Ҳм§Җл§ү мқҙлІӨнҠё, мқҙлІӨнҠё. мқҙлІӨнҠёлқјлҠ” кІғмқҖ м–ҙм©Ңл©ҙ лӘЁл“ кІғм—җ мқҳлҜёлҘј л¶Җм—¬н•ҳкі мӢ¶кё° л¬ём—җ
л¶Җм№ҳлҠ” мқҙлҰ„мқј м§ҖлҸ„ лӘЁлҘҙкІ лӢӨ. лӮҙк°Җ мӮҙм•„к°ҖлҠ” мқҙ лӘЁл“ лӮҳлӮ л“Өмқҙ мўҖ лҚ” нҠ№лі„н•ҳкі мқҳлҜёмһҲлҠ” лӮ мқҙм—Ҳмңјл©ҙ
н•ҳлҠ” к·ё к°„м Ҳн•ң л°”лһҢм—җм„ң к·ёл ҮкІҢ мқҙлІӨнҠёлқјлҠ” л§җмқҙ лӮҳмҳӨлҠ” кІғмқјм§ҖлҸ„ лӘЁлҘҙкІ лӢӨ.
м–ҙлҠҗ лӮ к°‘мһҗкё° лӮҳлҠ” мЈҪм—ҲлӢӨ, лқјлҠ” мұ…лҸ„ к·ёлҹ¬н•ң л§ҘлқҪм—җм„ң м•„мЈј лӮҙмҡ©мқҙ мң мӮ¬н•ҳлӢӨ.
м–ём ң лӮҙк°Җ мЈҪмқ„м§Җ лӘЁлҘҙлӢҲ мқҙ мҲңк°„ мҲңк°„мқҙ лӘЁл‘җ мқҳлҜёмһҲкі лң» к№Ҡкі нӣ„нҡҢк°Җ м—ҶлҠ” мӮ¶мқҙ лҗҳм—Ҳмңјл©ҙ н•ҳлҠ” к·ё л°”лһЁ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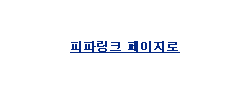


 [비룡мҶҢ] м–ҙлҰ° м•„мқҙмқҳ мӢңм„ м—җм„ң ліё мӢңк°„ мІ н•ҷ, лӘЁлӘЁ
[비룡мҶҢ] м–ҙлҰ° м•„мқҙмқҳ мӢңм„ м—җм„ң ліё мӢңк°„ мІ н•ҷ, лӘЁлӘЁ
 мҷ„л“қмқҙ к·ё м—¬мҡҙм—җ лҢҖн•ҙм„ң
мҷ„л“қмқҙ к·ё м—¬мҡҙм—җ лҢҖн•ҙм„ң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