лІ„мҠӨ м •лҘҳмһҘм—җм„ң лӮҳлҠ” мЎ°мҡ©нһҲ мқҳмһҗм—җ м•үм•„ лІ„мҠӨлҘј кё°лӢӨл ёлӢӨ.
кіјм—° н”јлҘј нқҳлҰ¬кі мЈҪмқҖ лӮЁмһҗлҠ” лҲ„кө¬мқјк№Ң к¶ҒкёҲн–ҲлӢӨ.
л¬јлЎ мЈҪмқҖ мӮ¬лһҢмқҙ м•„лӢҗмҲҳлҸ„ мһҲм—ҲлӢӨ. к·ёлғҘ н”јлҘј нқҳлҰ¬кі лҲ„мӣҢ мһҲлҠ” мӮ¬лһҢмқјмҲҳлҸ„ мһҲлӢӨ.
м§ҖкёҲмқҙлқјлҸ„ лӢӨмӢң к·ё мһҘмҶҢлЎң к°Җм„ң н•ңлІҲ нҷ•мқён•ҙ ліјк№Ң.
к·ёлҹ° л§ҲмқҢмқҙ л“Өм—ҲлӢӨ. к·ёлҹ¬лӮҳ лӮҳлҠ” к°җнһҲ мҡ©кё°к°Җ лӮҳм§Җ м•Ҡм•ҳлӢӨ.
лІ„мҠӨк°Җ мҳ¬л•Ңк№Ңм§Җ лӮҳлҠ” к·ёл ҮкІҢ л§қм„ӨмҳҖлӢӨ. к°Ҳк№Ң л§җк№Ң.
к·ёлҰ¬кі лІ„мҠӨк°Җ л“ңл””м–ҙ м Җ л©ҖлҰ¬м„ң м •лҘҳмһҘмқ„ н–Ҙн•ҙ мҳӨлҠ” кІғмқ„ ліҙкі м„ңм•ј лӮҳлҠ” мһҗлҰ¬м—җм„ң мқјм–ҙлӮ¬лӢӨ.
лІ„мҠӨлҘј нғҖкё°ліҙлӢӨ к·ё мһҗлҰ¬м—җ лӢӨмӢң к°Җліҙкё°лЎң н•ҳмҳҖлӢӨ.
мһҗл°•мһҗл°• к·ёл…Җ л°ңмһҗкөӯ мҶҢлҰ¬ л°–м—җ м—ҶлҠ” мқҢмӮ°н•ң кұ°лҰ¬лӢӨ.
м•—.!
텅비м—ҲлӢӨ.
м•„л¬ҙлҸ„ м—ҶлӢӨ. 분лӘ… н•ң лӮЁмһҗк°Җ н”јлҘј нқҳлҰ¬кі м“°л Өм ё мһҲм—ҲлҠ”лҚ° нқ”м ҒмЎ°м°Ё м—ҶлӢӨ.
н•ҸмһҗкөӯлҸ„ м—ҶлӢӨ.
мўҖм „ лӮҳлҠ” лӯҳ ліёкұёк№Ң.

лӮҙ лЁёлҰ¬ мҶҚмқҖ м–ҙм§Җлҹ¬мӣ лӢӨ. 분лӘ… лҲ„кө°к°Җк°Җ м“°л Өм ё мһҲм—ҲлҠ”лҚ°...м•„л§ҲлҸ„ к·ё мӮ¬лһҢмқҖ мЈҪмқҖ мӮ¬лһҢмқҖ м•„лӢҢ лӘЁм–‘мқҙм—ҲлӢӨ.
к·ём Җ мһ мӢң к·ёкұ°м—җ м“°л Өм ё мһҲм—Ҳкұ°лӮҳ м•„лӢҲл©ҙ мқҙлҜё лҲ„кө°к°Җк°Җ к·ё мӮ¬лһҢмқ„ лҸ„мҷҖмЈјм–ҙм„ң лі‘мӣҗмңјлЎң
к°”кұ°лӮҳ н•ңлӘЁм–‘мқҙм—ҲлӢӨ.
к·ё мғқк°Ғмқ„ н•ҳлӢҲ лӮҙ л§ҲмқҢмқҙ лӢӨмӢң нҷҳн•ҙм ё мҳӨлҠ” кІғ к°ҷм•ҳлӢӨ. кҙңн•ң кұұм •мқ„ лҚңмқҖ 기분мқҙм—ҲлӢӨ.
лӮҳлҠ” лІ„мҠӨ м •лҘҳмһҘмңјлЎң лӢӨмӢң к°”лӢӨ.
집м—җ мҳӨмһҗ м•„лІ„м§ҖмҷҖ м–ҙлЁёлӢҲк»ҳм„ң м Җл…Ғмқ„ мқҙлҜё л“ңмӢңкі кі„м…ЁлӢӨ. лӮҳлҸ„ лҒјм–ҙм„ң м Җл…Ғмқ„ лЁ№м—ҲлӢӨ.
лЁ№лҠ” лӮҙлӮҙ мҳӨлҠҳ лӮҙк°Җ кІӘмқҖ мқј л‘җк°Җм§Җ мҰү мғӨ넬 л„ҳлІ„ 5 н–ҘмҲҳлҘј кө¬н•ң кІғкіј м–ҙл–Ө мӮ¬лһҢмқҙ
м“°л Өм ё мһҲлӢӨлҠ” кІғ мӨ‘ н•ңк°Җм§Җл§Ң л§җн–ҲлӢӨ.
л°”лЎң мғӨ넬 л„ҳлІ„5 н–ҘмҲҳлҘј мЈјмҡҙ мқҙм•јкё°л§Ң н–ҲлӢӨ.
м—„л§Ҳк°Җ л§җм”Җн•ҳм…ЁлӢӨ.
"м–ҳ лҚ”лҹҪкІҢ мЈјмӣҢм„ң м“°л Өкі к·ёлҹ¬лӢҲ..."
лӮҳлҠ” л°ҳмӮ¬м ҒмңјлЎң лҢҖлӢөн–ҲлӢӨ.
"к·ёлҹј. м—„л§Ҳк°Җ н•ҳлӮҳ мӮ¬мӨҳ. к·ёлҹј. лҸ„лЎң м ңмһҗлҰ¬м—җ к°–лӢӨ лҶ“мқ„к»ҳ."
к·ёкұёлЎң мқҙм•јкё°лҠ” м«‘лӮ¬лӢӨ.

л°Ҙмқ„ лЁ№кі мўҖ кіөл¶ҖлҘј н•ҳлӢӨк°Җ к·ёлӮ мқҖ к·ёлғҘ мһӨлӢӨ. л¬јлЎ мқҳнҳ№мқҙ м „нҳҖ м—Ҷ진 м•Ҡм•ҳм§Җл§Ң мқјлӢЁ
мһҗкё°лЎң н•ҳмҳҖлӢӨ.
лӢӨмқҢлӮ . н•ёл“ңнҸ° м•ҢлһҢ мҶҢлҰ¬м—җ лӮҳлҠ” к№јлӢӨ.
мңјмқ‘.
лӮҳлҠ” кё°м§Җк°ңлҘј мјңл©ҙм„ң м№ЁлҢҖм—җм„ң мқјм–ҙлӮңлӢӨ. м–ҙлЁёлӢҲмқҳ м–јкөҙмқҙ л°©л¬ё нӢҲмңјлЎң ліҙмқёлӢӨ.
"м–ҳ. л№ЁлҰ¬ л°ҘлЁ№кі н•ҷкөҗ к°Җ."
м–ҙлЁёлӢҲмқҳ н‘ңм •мқҙ л°ңк°ӣкІҢ мғҒкё°лҗҳм–ҙ мһҲм—ҲлӢӨ. н•ҳкёҙ мҳӨлҠҳ м–ҙлЁёлӢҲмҷҖ м•„лІ„м§ҖлҠ” к°Җк№ҢмҡҙлҚ°лЎң м—¬н–үмқ„
к°Җкё°лЎң н•ҳм…ЁлӢӨ. л¬јлЎ лӢ№мқј м№ҳкё°м§Җл§Ң м—„л§Ҳ м•„л№ лҠ” лІҢмҚЁ кё°лҢҖлҗҳлҠ” лӘЁм–‘мқҙм—ҲлӢӨ.
к·ёлҹ° м—„л§Ҳм•„л№ мқҳ мӢ¬м •лҸ„ мқҙн•ҙк°Җ к°”лӢӨ.
м–јл§ҲлӮҳ мғқнҷңм—җ л§Өм—¬ мӮҙм•ҳмқ„к№Ң.
л¬јлЎ мҡ°лҰ¬ 집мқҙ лӮЁм—җ 비н•ҙ лӘ»мӮ¬лҠ” кұҙ м•„лӢҲлӢӨ.
к·ёлҹ¬лӮҳ лӮҳлҠ” мҡ°лҰ¬ к°Җм • м ңлҢҖлЎң мӮҙм•„к°ҖкІҢ н•ҳл ӨлҠ” м—„л§Ҳм•„л№ мқҳ н”јлӮҳлҠ” л…ёл Ҙм—җ мқём •н•ҳлҠ” нҺёмқҙлӢӨ.
"к·ёлһҳ. лӮҳлқјлҸ„ м—ҙмӢ¬нһҲ кіөл¶Җн•ҙм„ң нӣҢлҘӯн•ң мӮ¬лһҢмқҙ лҗҳм–ҙм•јм§Җ."
лӮҳлҠ” м ҲлЎң мқҙлҹ° нҳјмһЈл§җмқ„ лӮҙлҶ“кі н•ҷкөҗлЎң к°”лӢӨ.

нҳ№мӢңлӮҳ н•ҳлҠ” л§ҲмқҢмңјлЎң м–ҙм ң мӮ¬лһҢмқҙ м“°л Өм ё мһҲм—Ҳл“ кІғмңјлЎң ліҙмқҙлҠ” көҗм°ЁлЎң мҪ”л„ҲлҘј м§ҖлӮҳмҷ”м§Җл§Ң
к·ёкіім—җлҠ” лҲ„кө¬лҸ„ м“°л Өм ё мһҲм§Җ м•Ҡм•ҳлӢӨ. кІҪм°°мқҙ м§ҖнӮӨкұ°лӮҳ н•ҳлҠ” нқ”м ҒлҸ„ м—Ҷм—ҲлӢӨ.
н•ҷкөҗ м •л¬ё м•һм—җлҠ” л“ұкөҗн•ҳлҠ” мҡ°лҰ¬ н•ҷмғқл“ӨлЎң мқёмӮ°мқён•ҙмҳҖлӢӨ.
м •л¬ё м•һм—җм„ңлҠ” м„ лҸ„л¶Җ м„ мғқлӢҳк»ҳм„ң нҒ° лҚ©м№ҳлЎң м„ң кі„м…ЁлӢӨ.
лӮҳлҠ” л¬ҙмӮ¬нһҲ н•ҷкөҗ м •л¬ёмқ„ нҶөкіјн•ҳмҳҖлӢӨ.
"мҶҢлқјм•ј."
лҲ„к°Җ лӮҙ мқҙлҰ„мқ„ л¶Ҳлҹ¬м„ң л’ӨлҸҢм•„ ліҙм•ҳлӢӨ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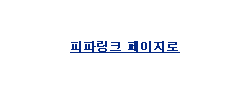


 мң„лҢҖн•ң лҸ„л‘‘мқҙм•јкё°!! 'н”јн„° лӢҳлё”кіј л§ҲлІ•мқҳ лҲҲ'
мң„лҢҖн•ң лҸ„л‘‘мқҙм•јкё°!! 'н”јн„° лӢҳлё”кіј л§ҲлІ•мқҳ лҲҲ'
 нҢҗнғҖм§Җ мҶҢм„Өн•ҳл©ҙ?? л°”лЎң мқҙкұ°м§Җ!! н•ҙлҰ¬нҸ¬н„° мӢңлҰ¬мҰҲ
нҢҗнғҖм§Җ мҶҢм„Өн•ҳл©ҙ?? л°”лЎң мқҙкұ°м§Җ!! н•ҙлҰ¬нҸ¬н„° мӢңлҰ¬мҰҲ


